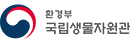[우리 땅, 우리 생물] 삼세기
예년에 비해 따뜻한 편이지만 겨울은 겨울이다. 깊은 바다에 살면서 겨울이 오면 알을 낳으러 얕은 곳을 찾는 물고기들이 있다. 암초 틈이나 모랫바닥에서 죽은 듯이 먹잇감을 기다리는 매복군. 삼식이란 이름으로 더 잘 알려진 물고기, 삼세기를 만나보자.
쏨뱅이목 삼세기과에 속하는 삼세기는 길이 40cm 정도까지 자라는 바닷물고기이다. 커다란 머리에 큼지막한 입. 가슴지느러미를 활짝 펼치고 입을 벌리면 포효하는 밀림의 왕 사자가 떠오른다. 머리에 비해 늘씬한 몸통, 등에는 삐쭉 삐죽 날카로운 등가시가 늘어서 있다. 몸 전체에 알록달록 무늬가 흩어져 있고, 크고 작은 돌기가 빼곡하다. 독이 있는 물고기로 유명한 쑤기미와 비슷하게 생겼지만, 다행히 독은 없다. 지역에 따라서 탱수, 수베기, 삼숙이, 삼식이라고 불린다. 우리나라에서는 서해, 남해, 동해 어디를 가든 볼 수 있으며, 요즘이 제철이다.
우리나라에 사는 5만 종이 넘는 생물들이 이름을 갖고 있다. 생물 하나하나에 고유한 이름을 붙여주는 나라는 세계적으로도 그리 많지 않다. 우리 바다에는 1천 종이 넘는 물고기가 저마다의 이름을 갖고 있다. 삼식이, 흔히 못생기고 바보스럽다는 놀림 말로 쓰인다. 사진 찍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카메라 렌즈를 떠올릴지도 모르겠다. 삼시 세끼 집밥을 챙겨 먹는 사람을 부를 때 사용하는 이도 있다. 염화강이 서해로 흘러드는 김포 대명항 어느 어물전 주인장에게 물어보니 “색깔이 셋이니 삼식이지, 삼식이”라며 너스레를 떤다. 흰색, 적갈색, 검은색이 조화롭게 썩어 있는 건 확실하다. 적갈색이 진하다 못해 붉게 보이는 녀석도 더러 있다.
시인 김춘수는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라 썼다. “이름을 불러주니 녀석은 나에게로 와서 물고기가 되었다”로 들리는 건 어류학자이기 때문일까. 오랫동안 기억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름이 필요하다. 삼식이, 소박하면서도 친근한 이름이다. 꽃으로 치면 호박꽃이라고 할까? 삼식이도 나쁘지는 않지만, 삼세기라는 멋진 이름으로 우리 바다에서 오랫동안 잊히지 않기 바란다.
김병직·국립생물자원관 환경연구관/수산학박사